철학자나 의사의 글과는 다른 울림이 있다. 90대의 작가가 책을 써서 사회 전체에 논쟁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승리이자 성취로 다가오기도 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단계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한 부분 에서부터 수용이 온다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겪어보았을 때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생각으로도 어느 정도 몰입 하느냐에 따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사람은 모두 어려서부터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살며 모두 다른 이해 방식을 터득한다
자기만의 이해방식이 모두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의 뇌는 안 좋은 기억 에 대하여 강하게 기억하는데 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더 빨리 잘 알게 된다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걸 찾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찾는 게 대부분 빠르지 않을까 싶다 (생존을 위해 안 좋은 것부터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을 기억해두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육체적 발전을 택하던가 정신적 발전을 택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신적 발전이라면 그 고통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이해해서 어떤 부분으로부터 생긴 고통인지 잘 알게 하고 다음에는 이길 수 있게 하는 발전 아닐까 생각한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인데 우리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분명 어떤 발전을 분명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분명 있고 그 한계점이 온 사람 또한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간에게는 고통이 아주 훌륭한 천적인 듯 싶다 과연 천적 없는 생물이 어떤 발전이 있을지 ..
아무튼 그렇기에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더욱더 깊은 이해심을 가질 기회를 가지게 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관계가 중요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 들게 하였다
나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정말 진짜 못하는 게 있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하여 우쭐거릴 필요 없고 진짜 못하는 것에도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못하는 것에서 우쭐거려서도 안된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라 생각한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덜 완벽하다던가 좀 아쉽게 완벽한 사람이라던가 무슨 차이인가
사실 나도 사람 같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부족함을 수용해서 완벽함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난 타인을 수용하는 큰 걸음이라 생각한다




세상 모두를 담을 듯한 사각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적이 있었다. 그 안에 모두는 아닐지라도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 철없던 시절도 있었다. 그 사각 프레임에 누군가는 목이 잘리고 누군가는 다리가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어가며 실체는 아웃포커싱의 테두리처럼 흐릿해지고 정중앙의 개인적 욕망만 또렷해졌다.
사각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을지 또는 무엇을 배제할지에 따라 사진의 느낌은 변한다.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보며 “예술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일상적인 것에서도 낯설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진을 보며 너라면 담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잘라내고 싶은 건 뭐냐는 질문을 했다. 사각 프레임은 마치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의 다른 이름처럼 들린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직 그 무엇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다. 아마 영원히 모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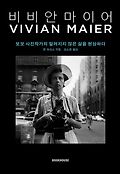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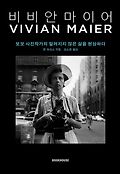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P37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다. P39
재능의 본질은 즐기면서 집중할수 있는 능력이다. P43
지금 이순간 자유로운 존재로서 있는 힘을 다해 살라는 것이다.p57
삶의 '위대한 세영역'은 사랑,일,놀이 이다.p61
Tbc...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익스펜더블’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임무에서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상관 없다. ‘익스펜더블’은 죽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다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무 수행 중에 죽으면 복제해서 기억을 그대로 이식한 채 다시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반물질을 이용하여 성간이동이 가능한 먼 미래에는 이런 일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나 보다.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 몇 년 사이 불의의 사고로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다.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을 얘기했다. 얼마나 많은 ‘김용균’이 나와야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는 외침도 있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한 일, 대체할 수 있는 소모인력, 자발적 선택, 뭔가가 겹쳐 보인다. 먼 미래가 아닌 현재에도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언제든지 대체가능한 ‘익스펜더블’은 존재한다. 이 소설의 미래 같은 사회적 합의가 없을 뿐이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기대된다.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와 손잡고 22년 7월 15일에서 25일까지 '비치리딩 시리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공허한 연대보단 차라리 화끈한 전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치라거나 의미, 전통, 문화 따위의 말들이 때론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린다. 그런 공허한 메아리에 응답해 연대를 이야기하는 저자의 목소리가 나에게 나이브한 소리처럼 들렸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최선이 연대의 밥상인 것도 사실이다. 무얼 할 수 있겠어. 이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정말 그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