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뮈의 시지프 신화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인간이 신 없이 살 수 있을까? 영원을 구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조리를 용인할 것인가? 어느 날 문득 여태껏 살아온 나의 삶이 구덩이를 파고 내가 판 구덩이를 다시 메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뒤, 그러고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1.각성
익숙한 무대 장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닥친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차로 출근하기,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네 시간 근무, 식사, 전차, 네 시간 근무, 식사, 잠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한 일정은 대부분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어느 날 문득 <왜>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놀라움이 동반된 이 무기력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2.해답
시지프의 말 없는 모든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고, 그의 바위도 그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인간이 그의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면 모든 우상은 입을 다물게 된다. 느닷없이 자기 침묵으로 되돌아간 세계 속에서, 이 땅의 수많은 목소리, 경탄에 마지않는 작은 목소리들이 수없이 솟아난다. 무의식적이고 비밀스러운 호소, 모든 얼굴들을 초대하는 이 목소리들은 승리의 필연적 이면이자 대가이다. 그림자 없는 태양은 없는 법이기에 어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부조리한 인간은 〈예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카뮈의 해답 역시 ‘노오력’ 이다. 다만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노력이다. 시지프는 아무리 노력해도 100억 부자가 되거나 100만 팔로워를 얻진 못한다. 노력은 실제 삶의 개선을 보장하지 않는다. 돌덩이는 어제 그랬듯 오늘도 또 굴러 떨어진다. 그리고 내일도 또 굴러 떨어질 것이다. 바위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돌을 밀어 올리는 그 순간 그는 잠깐 미소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터질듯한 팔의 근육통과 흙먼지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음미한다. 운명이 우리 삶에 목적이 없다고 비난할 때에도 우리는 고통에 색깔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때 신은 그의 자리를 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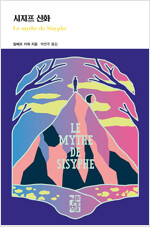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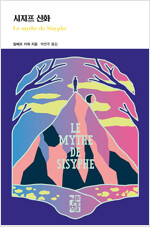

꺾이고 쪼였던 젊은 영혼만이 전해줄 수 있는 생생한 실감이 있다. 해방, 용기, 치유의 기록이자 바다, 햇빛, 서핑에 대한 책이고, 어쩌면 그 단어들은 다 같은 걸 달리 부르는 건지도 모르겠다. 서핑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들었지만 나 같은 몸치는 안 될 거야, 아마.


한국인 사진 기자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자가 쉽고 맛깔나게 푼 사진 이야기. 우리 시대 사진이란 하나의 언어이며, 제대로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맥락에서 심령사진, 누드사진, 셀카, 사진 포즈, 권력자의 사진이 말하거나 거기에 담긴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설명한다.


오늘은 어제가 되고 내일은 오늘이 된다.
오늘과 내일이라고 할 때는 시간의 간격이 길지 않게 느껴지는데 올해와 내년이라고 하면 시간의 간격이 멀어지는 느낌이다.
12월 30일에서 12월 31일이라고 할 때와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라고 하면 더더욱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다.
3분 후면 12월 31일이 되는데, 그 다음날은 내년이다.
어릴 때는 12월 31일에 큰 다짐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다짐이 적어지고 지긋지긋한 올해가 빨리 가버렸으면 하게 되었다.
살아온 날들보다 어쩌면 살아갈 날들이 적어진 나이.
그래서 내일은 좀 큰 다짐도 해보며 1월 1일을 맞이해보고 싶어진다.
새해의 해돋이를 보겠다며 부지런을 떨고 먼 길을 간 적은 없지만 2024년은 좀 다르게 맞이하고 싶어진다.
며칠 차이로 내년을 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누군가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이제 내일이면 1월 1일이다.
누군가는 맞이하지 못한 2024년을 허투루 맞이하지 않고 야무지게 맞이하고 다시 어린 마음의 두근거림을 가져보려 한다.
모두 2023년 마지막 날은 평안하기를…
수고한 나, 그리고 당신,
24년으로 훌쩍 잘 뛰어넘기를!


다섯 편이 다 어쩌면 이렇게 여운이 남을까. 요코야마 히데오의 소설은 모두 정말 현실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취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건조한 문체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인물들의 마음속 울렁거림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서이기도 한 것 같다.


책 앞머리에 적힌 수많은 추천사들처럼 나도 하루 만에 다 읽었다. 재미있었다.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했고. 다중우주들 사이를 돌아다니게 하는 기계나 그 사용법은 썩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결말의 해결책은 생각해보면 여러 캐릭터들에게 참 무섭고 잔인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다.


692 페이지의 <64>, 480 페이지의 <빛의 현관>등 굵직한 작품들을 쓴 요코야마 히데오.
과연 그의 단편은 어떨까?
<진상>은 총 5개의 짧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작품집이다. 이야기마다 배경이 다르고 재미가 다르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자신만의 결함, 비밀, 치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슷하다.
마지막 작품 <꽃다발 바다>의 여운이 길다. 작가는 60페이지짜리 단편에도 얼마든지 풍성한 플롯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보여준다.


한 해 동안 다들 고생 차암 많으셨습니다.


뇌과학자가 쓴 로마 이야기. 로마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부분은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다. 로마의 몰락에 현대 선진국들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퇴행 분위기를 겹쳐보는 대목들에서는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다. 로마는 멸망 순간까지 자신들이 왜 망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