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다 읽고 나서 느껴지는 감각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란 어렵다. 그런 감각으로 기억되는 소설이 있다. 묘사가 특별히 감각적이어서가 아니다. 어떤 소설은 다 읽은 후에 4D 영화를 보았을 때처럼, 피부에 닿는 현실의 감각이 남는다.
『움푹한』은 그런 소설이었다. 나만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서 작가와 독자가 함께한 낭독회에 참석했다. 장대비가 내리는 초여름의 저녁이었다. 습한 공기가 감도는 책방에서 이 책의 문장이 소리내어 읽힐 때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대��목을 읽은 독자가 나타났을 때 확신했다. 그것은 나만의 공상이 아니었다고.
곁이 생긴 기분.
다정한 세계는 위태로운 세계다. (1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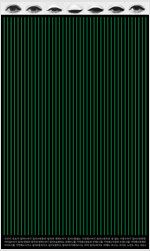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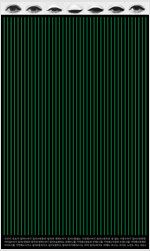
‘아, 엄마가 좀비가 됐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겠지’ 싶었지만 이야기가 꼭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아서 재미있었다. 주인공 소년은 문제아지만 공부를 잘하고, 아버지는 비록 바람은 피웠지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학교 일진도 처음부터 주인공을 괴롭힌 것은 아니다. 좀비는 가끔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영상화 판권이 팔렸다고 한다.


일제가 만주국을 설립하며 군국주의를 본격적으로 펼치던 1932년, 경주 서악동 고분군의 한 묘에서 미라 상태의 머리가 발견된다. 이게 혹시 김유신의 머리일까? 그와 함께 마을에 기괴한 사건들이 벌어지다가 급기야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정황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겹치는 듯하다. 서악동 고분군에 대한 자료를 계속 검색해가며 정신없이 읽었다. 김유신의 최후에 대한 가설이 정말 그럴듯했다.


정•경•언유착을 다룬 영화 <내부자들>은 2015년 11월 19일에 개봉했다. 이 책은 같은 해 11월 27일에 출간되었다. 시대적 흐름이란 게 정말 있어서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소설에서 도파민 폭발을 경험할 수 있다면 믿겠는가. 나도 이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경험했다. 250여 쪽 분량을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반전이 탁월하고, 꼬집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선명하다. 쉽게 말해 재미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소설이다.
이 책이 한 해에 두 개의 문학상을 받은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곧 있으면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의 안국진 감독이 연출하고, 손석구 배우가 주연을 맡은 동명의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는데 무척 기대된다.


민음사 (240216~240228)
❝ 별점: ★★★★
❝ 한줄평: 설명하기 어려운 ‘좋음’
❝ 키워드: 사랑 | 인간 | 슬픔 | 영혼 | 빛 | 거리 | 죽음 | 마음 | 꿈 | 아픔 | 생각
❝ 추천: ‘황인찬의 세계’가 궁금한 사람
❝ 그래도 우리는 걸을 거야 추운 겨울 서울의 밤거리를 자꾸만 걸을 거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막 걸을 거야 우리 자주 걸을까요 너는 아직도 나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나는 너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계속된 일인지 우리는 모른다 ❞
/ 「종로사가」 (p.41)
———······———······———
✦ ‘민음의 시’ 시리즈의 시집은 처음 읽어보는데요. 민음북클럽 잡동산이를 읽으면서 민음사에서도 국내 시인들의 시집을 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난 패밀리데이 때 궁금했던 시인들의 시집을 구매했었어요. 황인찬 시인의 두 번째 시집 『희지의 세계』는 그때 구매했던 시집 중 한 권입니다.
✦ 황인찬 시인은 문학동네의 시 뉴스레터 ‘우리는 시를 사랑해’ 시즌 2의 필진으로 참여하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2주에 한 번 받아보는 글이 정말 좋아서 시집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가 엄청 난해하진 않은데 뭔가 알듯 말듯한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왜 좋은지 딱 짚어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냥 좋았어요. 종로 시리즈 중에서는 「종로사가」라는 시가 제일 좋았는데, 언제부터, 얼마만큼 오래 계속된 것인지도 모른 채 거리를 끝없이 헤매는 두 사람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 겨울 느낌의 시들도 많았지만, 여름 생각이 나는 시들도 많아 언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겨울 느낌의 시들에서 좋았던 구절이 많아서 다음 겨울에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인의 첫 번째 시집 민음의 시 189 『구관조 씻기기』와 최근 시집 문학동네시인선 194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하자』도 궁금해지는 시집이었습니다 🥰 [📝 24/02/28]
———······———······———
✴︎
그렇다면 저 새하얀 것들은 무엇일까 저걸 뭐라고 부르나 나는 대체 무엇으로 창을 닦은 걸까 또 바깥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모두 하얗다 보이지 않는다 눈은 내리지 않는 것이다 겨울은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인 것이다 그렇다면 저 새하얀 것들은······
/ 「이 모든 일 이전에 겨울이 있었다」 (p.39)
✴︎
다만 나는 여름에 시작된 마음이 여름과 함께 끝났을 때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도무지 알기가 어렵고
마음이 끝나도 나는 살아 있구나
/ 「건축」 (p.84-85)
✴︎
자신이 녹는다는 것을 알아 버린 눈이 전력을 다해 서서히 녹아내릴 때, 유리는 생각을 했다 다 녹고도 남아 있는 눈의 흰빛을 받으며 생각을 했다
유리가 보는 것은 유리에 비친 것들에 대한 생각이고
유리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다
/ 「무정」 (p.94-95)
✴︎
이 어두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는 알았다 내 사랑의 미래가 거기에 있고 지금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
나는 깜짝 놀라서 집을 나왔고
이제부터 평생 동안 이 죄악감을 견딜 것이다
/ 「인덱스」 (p.128)
———······———······———
🗒️ 좋았던 시
1부 | 실존하는 기쁨
✎ 「새로운 경험」
✎ 「희지의 세계」 ⛤
✎ 「조물」
✎ 「이 모든 일 이전에 겨울이 있었다」 ⛤
✎ 「종로사가」 ⛤⛤
✎ 「혼다」
✎ 「저녁의 게임」
✎ 「종의 기원」
2부 | 머리와 어깨
✎ 「다정과 다감」
✎ 「조율」
✎ 「소실」
✎ 「물산」
✎ 「건축」 ⛤
✎ 「유사」
✎ 「무정」 ⛤
✎ 「지국총」 ⛤
3부 | 이것이 시라고 생각된다면
✎ 「이것이 시라고 생각된다면」
✎ 「기록」
✎ 「영원한 친구」
✎ 「너의 아침」 ⛤
✎ 「인덱스」 ⛤
———······———······———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서관, 2024 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학습공동체‘도도한 북클럽’운영
월간경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독서학습공동체 '도도한 북클럽'이 소개되었습니다. '도도한 북클럽'은 매월 한 달에 한 권 같은 책 함께 읽기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배려와 존중의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도서관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권연대 숨 소식지 2024년 2월호 ‘현경이랑 세상 읽기’ 꼭지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 벨빌 일기 / 글쓴이: 박현경(화가, 교사)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오후, 청주 집
모든 준비를 마쳤고, 내일 새벽 출발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주님, 이 모든 일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손수 이루어 주십시오.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오전, 파리 벨빌(Belleville) 숙소
한 시간 후면 그림들 이끌고 전시장에 설치하러 간다. 묘한 설렘과 긴장.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다.
같은 날 오후, 카페 플뤼랄
설치를 마치고 쓴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만나던 발레리, 레아, 하울을 드디어 직접 만났다. 인사를 나누고 작품 포장을 풀고 전시장에 이리저리 배치하면서, ‘뛰어넘다(franchir)’라는 주제로 각자 작업해 온 결과물을 공유했다. 발레리, 레아, 하울, 나, 우리 남편이 힘을 합쳐 작품 설치를 했다. 크리스틴은 오늘 급한 일이 있어 오지 못해 크리스틴 작품도 우리가 걸었다.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오전, 숙소
어제 오전에 남편이랑 20분 정도 걸어서 금속 가게에 가서 자그맣고 반질반질한 동판 두 개를 사 왔다. 내일 아침 하울과 함께, 나로서는 중학교 이후 처음으로 금속 판화를 해 볼 생각에 무척 설렌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이었나, 문득 잠이 깼을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큰일을 벌였을까, 만일 전시 판매 성과가 좋지 않다면, 이 큰 짐을 끌고 프랑스까지 왔다 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내 제안으로 모인 이 아티스트들(발레리, 레아, 크리스틴, 하울)에게 내가 미안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별안간 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더 푹 자고 나서 깨니, 그런 회의적인 생각은 쏙 들어가고 설렘이 되살아났다. 판매 성과는 중요하지 않다. 이 먼 곳에 와서 이곳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은 베르니사주(vernissage, 전시 오프닝 파티)가 있는 날. 많은 사람을 만나 신나게 수다 떨고 술도 마시고 즐겨야 하므로, 오전 동안은 집에 틀어박혀 쉬기로 한다.
2024년 2월 4일 일요일 오후, 갤러리
어제 하울의 판화 수업에 참여해 나의 첫 판화 작업을 하는데, 눈물이 핑 고일 정도로 좋았다. ‘육체 노동’. ‘물질성’.
전시장에 도착해 셔터문을 올리고 들어가 난방을 켜고 조명을 켜고 통유리창 셔터들을 올리고 바닥 청소를 하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오후, 갤러리
4시 44분. 발레리랑 하울이랑 셋이 앉아서 책도 읽고 수다도 떨고 핸드폰도 들여다보며 포도주 한 잔씩을 홀짝이는 이 시간.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하고 감사하다.
2024년 2월 10일 토요일 새벽, 숙소
설날을 파리에서 맞고 있다. 어제 저녁엔 어쩐 일이었는지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 봐’ 두려운 마음이 마구 되살아났었다. 피곤해서 그랬다 보다.
오늘은 오전에 하울이랑 판화하는 날. 물고기, 꿈꾸는 물고기를 새기자.
같은 날 저녁, 숙소
지금 기분은 어제 저녁과는 전혀 다르다.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든다. 오늘은 갤러리에 발레리의 남편 브뤼노와 딸 모르간, 그리고 크리스틴의 딸 소냐가 왔다. 브뤼노, 모르간, 소냐가 그림에 대한 내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 주고 칭찬을 많이 해 줘서 기분이 좋았다. 갤러리 문 닫기 전 40분 정도 브뤼노랑 발레리랑 한국 문화, 내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 시간도 참 좋았다.
2024년 2월 11일 일요일 오전, 카페 플뤼랄
이번 체류 기간 중에 즐기는 마지막 일요일이자 전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하루하루 한 순간 한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하다. 위대한 하울과 함께, 그리고 크리스틴, 발레리, 레아와 함께 전시를 했다는 점, 이들과 엄청나게 수다를 떨고 이야기 나눈 모든 순간, 또한 이들 모두 이 전시에 대해 만족스러워한다는 사실, 이 모두가 감사하다.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새벽, 무극 관사
벨빌에서 쓴 일기를 찬찬히 읽어 보니, 나는 참 줄기차게도 두려워하고 의심하다가, 또 줄기차게도 안심하고 감사했구나. 창밖이 서서히 밝아 오고 오늘 출근해서 할 일들이 빼곡한데, 결국 난 또 안심하고 감사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다.’
그림(판화)_박현경, 천사


보름쯤 뒤에 출간할 산문집 표지입니다. 예쁜가요? 제목도 괜찮은가요? ^^


꽤 오랫동안 New York Times 디지털 구독자였지만 Binyamin Appelbaum은 낯선 이름입니다. 그나마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저자인 Thomas Friedman 정도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보통 신문을 다 읽어도 경제관련 뉴스를 잘 읽지 않았죠.
우연히 강양구기자가 주도하는 “벽돌 책 함께 읽기”에 참여해 『경제학자의 시대』를 독파했습니다. 주거래 책방 알라딘에서는 번역본의 가격이 31,500원인데 Amazon Kindle Edition은 단 $10.46, 당연히 경제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친절한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The Economists’ Hour: False Prophets, Free Markets, and the Fracture of Society” 뭐 이정도면 다 준 거죠.
1960년대까지 미국 정부 관료 세계에서 경제학자들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온 경제위기, 그리고 그 해결책을 관철시키는 경제학자와 그 관점에 귀 기울인 대통령이 등장하며 경제학자의 시대가 1969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진원지인 시카고대학 경제학과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이 미국을 시작으로, 세게 많은 국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진격의 프리드먼을 보면서 왜 이 책이 선택됐는지에 대한 느낌이 대충 옵니다. 2006년 죽은 밀턴 프리드먼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부활했죠. 2023년 경제성장율이 일본에도 뒤처졌다는 소식을 분석하며 정부의 역할 부재가 많이 언급된 걸 기억합니다.
제목을 『경제학자의 시대』라 쓰고 『프리드먼과 아이들의 시대』라 읽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의 존재감은 이 벽돌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시작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시대가 가고 프리드먼의 시대가 도래한 개기는 결국 그 당시 산적된 경제위기입니다. 다수의 경제학자가 소개되는데 저자가 소개하는 방식은 일관됩니다. “A was born in …”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경제적 환경이 그 사람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꼼꼼하게 다룹니다.
경제를 모르는 제가 읽은 바로는 프리드먼은 시장 자유주의자입니다. 그의 대처법은 “시장에 맡기자”로 요약됩니다. 관료가 손을 때면 결국 시장이 알아서 가장 “efficient”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equality”죠. 시장은 전자를 선택하고 후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제에 언급된 “False Prophets”는 프리드먼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이고, “Free Market”는 그들이 제시한 만병통치약 “panacea”였으며, 그 결과는 “the Fracture of Society” 깨져버린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저자는 경제학자 없이 정책을 만들자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한 정책을, 예를 들어 낮은 인플레이션,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정책결정을 경제학자의 손에 맡긴 후유증으로 세계 경제는 시장만능, 시장자유로 빠져버렸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칠레, 아일랜드 상황을 소개하며 그 폐해를 책 끄트머리에 저술합니다.
열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며 이를 하나로 모으는데 각 단원을 따로 읽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미국 경제사를 다루기 때문에 미국 정치를 너무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경제학자가 다수 등장함에도 놀라울 정도로 잘 읽히는 책입니다.
1969년에 시작된 경제학자의 작은 혁명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끝났습니다.
인상적인 구절을 공유합니다.
“Alchemists promised to make gold from lead; economists said they could do it ex nihilo, through better policy making” (5).
“In the four decades between 1969 and 2008, a period I call the “Economists’ Hour,” borrowing a phrase from the historian Thomas McCraw, economists played a leading role in curbing taxation and public spending, deregulating large sectors of the economy, and clearing the way for globalization” (5)
“But the market revolution went too far.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developed nations, it has come at the expense of economic equality, of the health of liberal democracy, and of future generations” (6).
“American economists are sometimes divided into two camps, one of which is said to be headquartered in Chicago and to favor markets in everything, while the other is said to be headquartered in Cambridge, Massachusetts, and to favor the heavy hand of government. These camps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freshwater” and “saltwater.” Far too much is made of such distinctions; the leading members of both groups favored the key shifts described in this book” (16).
“The triumph of free-market economics is sometimes illustrated by a satellite image of the Korean peninsula at night, the southern half illuminated by electricity, the northern half black as the surrounding ocean. It is a powerful image, but its significance has often been misrepresented. South Korea, like other wealthy nations, rose to prosperity by carefully steering its economy. This is the story of what happened when nations decided to take both hands off the wheel” (18).
“One of the most striking shifts was his emphasis on Americans as consumers, rather than Americans as workers” (170).
“Milton Friedman said of John Maynard Keynes that if he had lived long enough, he would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free-market counterrevolution. Perhaps if Friedman had lived a few years longer, even he would have recognized that the counterrevolution had gone too far. “The idea that the markets were always right was mad,” said French president Nicolas Sarkozy. “Laissez-faire is finished”” (316)
“A strong social safety net is necessary to sustain a market economy, just as a market economy is necessary to sustain a strong safety net. The economic historian Karl Polanyi observed that these imperatives—the reliance on markets and the commitment to provid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rose together in a “double movem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Polanyi described the two forces as opposed: fairness eroding capitalism; capitalism eroding fairness.36 A more optimistic view is that these forces can exist in productive tension, as during the mid-twentieth century, when the United States simultaneously expanded its safety net and its market economy. By contrast, in recent decades, America has pursued economic growth without sufficient regard to the strength of the safety net, and it is the imbalance that has proven destructive” (328)
“Our problem is too many markets, and too much walking away. If you have taken anything from this book, I hope it is the knowledge markets are constructed by people, for purposes chosen by people” (332)
“But the measure of a society is the quality of lif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not the top” (332)
All quotes drawn from:
Appelbaum, Binyamin. The Economists' Hour: False Prophets, Free Markets, and the Fracture of Society. Little, Brown and Company. Kindle Edition.


기운을 내고 싶어도 그게 참 안 되는 시간도 있다. 위로에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어서 입을 다물게 되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게 보통이다. 그 와중에 전혀 뜻밖의 무언가가 머리를 확 흔들어주는 일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책이었다.
뇌과학 서적이 한창 유행 중인 가운데 뒤늦게 좀 읽어보자 싶어서, 추천사도 많고 얇고 글자도 큰 이 책을 선택했는데 참 뿌듯하다. 뇌의 진화라는 기존 통념의 오류, 네트워크, 성장과 세부조정 등을 큼지막한 각주까지 동원해서 설명해주니 처음 접하는데도 흥미진진하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 소개된 모든 용어를 한 번에 다 외우기는 무리겠지만, 다른 뇌과학 책들까지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 책이 단순히 재미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낮춰준 것은 아니다. 4강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디선가 비슷한 말을 들어봤으면서도 과학을 통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와닿는 느낌이 정말 다르다. 자신의 뇌가 가진 학습을 통한 예측 기능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이끌 수 있고, 어른이 된 후 나의 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가진다는 것...저자의 질문을 나도 계속 곰씹게 된다. 조금씩이라도 내가 뇌의 예측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내 삶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뇌과학 책들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