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부를 지날 때까지만해도 장재현 감독의 최고작이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파열음을 내며 황망한 엔딩으로 치닫는다. 그럼에도 로케이션과 김고은의 연기가 좋다.


하루키의 소설을 팬은 아니었지만, 그의 에세이에 빠져 짧은 2주 만에 세 권이나 들었어. 특히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수필집이 글 쓰고 싶어 하는 나에겐 너무 좋았어.
예술가들은 보통 영감에 의존해 작업할 것 같지만, 하루키는 마치 직장인처럼 규칙적인 루틴으로 글을 써. 아침 일찍 일어나서 5-6시간 동안 글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해. 그리고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달리거나 수영하며 체력을 유지해. 그는 소설가, 특히 장편 소설가에게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더라고. 나도 이 부분에는 동의해.
하루키의 이런 일상과 작업 방식을 보니, 창작에 있어서 규칙적인 습관과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돼. 소설가의 삶이 단순히 영감에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어. 그의 에세이를 읽고 나니, 나도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해보고 싶어졌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역��시나 체력이 제일 중요해.


요즘 내가 듣고 있는 오디오북은 스티븐 킹의 "On Writing"이야.
한국어 번역판 제목은 '유혹하는 글쓰기'인데, 솔직히 이 제목은 좋은 번역은 아닌 거 같아.
이 책도 다른 작가들의 글쓰기 관련 책처럼,
-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 그리고 글을 쓰려면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는 거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작가 본인이 직접 읽어주는 이 오디오북은 진짜 매력적이고 재밌어.
스티븐 킹이 얼마나 타고난 스토리텔러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줘. 그의 소설은 내 취향이 아니지만, 이 책을 듣고 나니 왜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리고 가장 성공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알겠더라고.
스티븐 킹의 글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생각, 그리고 작가로서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한 내용은, 글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거 같아.


위즈덤하우스 (240229~240229)
❝ 별점: ★★★★
❝ 한줄평: 비밀을 품은 여자애 혹은 소녀 혹은 여자
❝ 키워드: 학창 시절 | 사춘기 | 과도기 | 고민 | 단짝 | 우정 | 소녀 | 비밀 | 초대 | 원망
❝ 추천: 비밀스러운 소녀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
❝ 저 남자애는 알까? 팔짱을 끼는 여자애들은 잔망 떠는 연습을 내게 다 한 뒤에 진짜로 좋아하는 남자애에게 선보이러 떠난다는 걸. 나하고 연습했다고는 말하지 않으면서. ❞ (p.55)
💖 첫 문장: 나를 곁에 두길 즐겼던 여자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p.5)
———······———······———
✦ 위픽 역대 조회수 1위라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을 때는 아쉽게 놓쳐서 읽지 못했는데요. 단행본 출간 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읽어 보니 많은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여자애도, 남자애도 될 수 없어 교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붕 떠 있는 아이. 교실 어딘가에 있었을 그 아이를 어렴풋이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그 아이에게서 자신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 저학년도 고학년도 아닌 어중간한 학년, 어린이도 청소년도 아닌 어중간한 나이, 여자애도 여자도 아닌 어중간한 소녀. 애매모호한 과도기의 어떤 심리를 정말 섬세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밀’ 이야기와 놀이를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함께 비밀스러운 여정에 동참한 것처럼 숨을 죽여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 ‘비밀이 고여드는 우물’인 ‘나’. 기억은 나지 않아도 누구나 어릴 적 친구와 속삭인 비밀 한 개쯤은 있겠죠. ‘비밀은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비로소 비밀인 걸까?’(p.45)라는 ‘나’의 물음처럼 그때는 왜 그렇게 비밀을 만들어 서로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걸까요. 그 시절의 교실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느낌이 생경하면서도 또 그립기도 했습니다.
✦ 지금까지 읽었던 위픽 시리즈 중에 가장 짧았던 것 같아요. 위픽 시리즈는 단행본마다 분량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올해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즌 2는 분량이 좀 더 긴 거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중편 정도의 볼륨이면 책 구매 의향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 24/02/29]
———······———······———
✴︎ 나를 곁에 두길 즐겼던 여자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머리를 양 갈래로 땋길 좋아하고, 업신여기는 표정이 기본인 애들. 그런 얼굴을 하도 많이 하다가 코도 조금 들창코가 된 것처럼 보이는 애들. 눈치도 안 보고 분홍이거나 주홍인 물건을 고르는 애들. (p.5)
✴︎ 여름방학의 어느 날 저들은 모두 한 번씩 혼자서 나를 찾아왔었다. 서로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뒷문으로만 내어놓는 비밀들이 고여드는 우물이다. 마음속에서 그 비밀들이 서로 닿지 않도록 분류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는 짜릿하고 누군가에게는 잔인할 그 작은 접촉이 내게 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가늠해본다. (p.7-8)
———······———······———


의재상 감시관 불불낭이라~ 줄여쓰기 좋아하셨는 줄은^^;


Isaac Reznikoff (Ferguson's grandfather)
Yiddish : Ikh hob fargessen (I've forgotten) -> Ichabod Ferguson
Fanny Grossman (Ferguson's grandmother)
14 Louis - Lew married to Millie,
12 Aaron - Arnold,
9 Stanley - Sonny (Ferguson's father)
4th child?
Rose Adler (Ferguson's mother, youngest of 3 second-generation Ferguson sisters-in-law)
Ben Adler - Emma Bromowitz (maternal grandparents)
Mildred Adler (Rose Adler's older sister)
In the long run, stories are probably no less valuable than money, but in the short run they have their decided limitations.
Times were tough, and the threat of destitution filled the rooms of the apartment like a dense, blinding fog. There was no escape from fear, and bit by bit all three boys absorbed their mother's dark ontological conclusions about the purpose of life. Either work or starve. Either work of lose the roof over you head. Either work or d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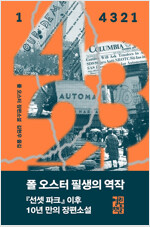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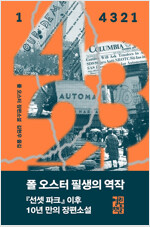
방 상태가 머릿속 상태랑 비슷하다고 어디선가 말하던데, 진짜라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서재를 둘 형편도 아닌데 책이 아까워서 처분도 못하니 창고가 따로 없다. 일단 좀 처분은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으나, 아쉬움에 한 번은 더 읽고 정리하기로 해서 방에 숨통 트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최근 메모리맨 시리즈가 한국에서도 잘 나간 듯 하고, 원래도 잘 나가는 액션 소설 작가인 발다치. 읽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 원서는 알라딘 매장에도 많고 도서관에도 있다. (재고가 많은지 팔기는 어렵다...) 그 중에서 이제 꽤 묵은 시리즈 중 하나인 카멜클럽의 마지막 권 Hell's corner를 드디어 정리한다. 안녕...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시리즈 중에서 당시 제일 팔렸는가 3권인 스톤콜드만 번역이 되었다. 미쿡 액션 소설이야 어느 권을 집어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항상 어느 정도 설명은 있지만, 3권만 보고 이해가 다 갈지 좀 의심스럽긴 하다. 특히 2권에서, 주역 중 한 명인 애너벨의 역할을 모르면 별로 와닿을 게 없지 않을까.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는 묘지 관리인 올리버 스톤과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친구들의 모임 카멜 클럽이 우연히 사건에 말려들면서, 해결 과정에서 스톤의 과거가 드러나고, 과거 때문에 사건이 꼬이지만 결국 해결하고, 시원한 액션도 보여주고, 조금 쓴 맛도 보지만 적에겐 더 쓴 맛을 보여주면서 진행되는 카멜 클럽 시리즈. 아무래도 액션 스릴러가 메인인 오락 소설이니, 가끔 진짜 놀랄 정도로 감정처리가 가벼운 부분도 있지만 - 1권 마지막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죽음이, 시리즈 마지막까지 다시 언급이 안 된다거나 - 발다치에게서 톨스토이를 바라고 읽는 사람은 없을테니 신경쓰지 말고 넘어간다.
5권 내내 별일을 다 겪다가, 마지막 권인 헬스 코너는 작가가 작정하고 시즌 파이널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관계되는 나라 숫자부터 다르고 나올 수 있는 관계자들은 다 나오고. 전혀 안 그럴 것 같다가 갑자기 캐릭터를 훅 보내는 경우도 있는 발다치라 한 두어명은 보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음. 이 책이 나온지가 십 년이 넘었는데 이미 그때 나노머신 기술을 구사한다는 소재가 나온 걸 보면, 역시 국가 보안 쪽에서는 이런 쪽 운용하려는 시도가 빠르구나 느껴지기도 하고. (톰 클랜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료 조사할 때 아예 언급이 안 된 걸 소재로 써먹지는 않겠지 싶다) 잠시나마 스톤의 왓슨 역할을 자처한 챕먼의 액션이 시원해서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느낌이고...카멜 클럽이 국가의 위기를 구했고, 나도 속이 좀 풀렸으니 이제 책과 작별할 시간이 왔다. 잘가 카멜 클럽...바이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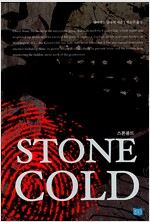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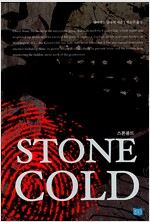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소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1) 정말 쓰고 싶었던(=읽고 싶었던) 소설, (2) 절대 쓰지 못할 것 같은 소설.
『흰』은 후자에 속한다. 그래서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닿을 수 없는 정상을 바라보는 등반가의 심정이 이런 기분일까? 상실의 경험을 이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형상화했다는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솔직한 나의 감상이다.
작가는 흰 것에 관해 썼다고 하지만 내게는 바르샤바의 차가운 겨울이 인상에 남는 그런 소설이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발견되는 좋음이 있다. 그러므로 책 속 문장을 인용하는 것 외에는 이 책에 대한 말을 더하기 어려울 것 같다. 「눈보라」에 나오는 대�목이다.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일까, 이 차갑고도 적대적인 것은? 동시에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것은? (6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