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목요일(7월25일)은 21장 '케임브리지와 캘커타 사이에서'를 읽습니다.
이 장에서 센은 아직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도로 돌아가서 캘커타의 신생 대학(자다브푸르 대학)의 경제학과의 학과장을 맡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석사 학위만으로도 교수에 임용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많았던 사정을 염두에 두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12. <세상이라는 나의 고향>
D-29
화제로 지정된 대화

YG

borumis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갔지만 당시 인도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화로 풍자된 것만 봐도 당시 반발이 얼마나 세고 뒷말이 오갔을지 상상이 가네요. 너무 젊어서 그런지 할아버지 뻘인 Sushil Dey가 말할 땐 결국 질 수 밖에 없는 모습에서도 젊은 교수의 한계가 보이네요.
저는 이 챕터에서 Ranajit Guha가 거의 저서에서 초점을 맞춘 영국의 좋은 의도가 결국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새로운 초점에 맞춘 것 외에도 역사관을 서발턴 이론의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게 한 것에 대해 흥미가 가네요. 이 당시 서발턴 연구가 잘 확립되지도 않았고 저도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덕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이후인 지금도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나 남녀차별 등으로 이렇게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간 서발턴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가 부족할 듯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지방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주목받지 못하는 집단이 많으니..
참, Khrushchev가 학생에게 전쟁과 평화 작가에 대해 물어보자 비밀경찰이 '자백'을 학생에게서 뜯어낸 일화는 정말 웃프네요..;;;

borumis
Isaiah Berlin도 나왔습니다. (왜 이 분은 안 나오나 했더니;;) 근데 앞에 제가 젊은 교수의 한계라고 했는데 알고보면 센의 한계보다 이건 Dey등 아직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인도 학계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대가는 아무리 알려져 있지 않은 풋내기의 의견도 경청하는 걸 보여준 좋은 예죠. 개인적으로 스피노자를 엄청 좋아해서 Berlin이 Spinoza와 Sen의 의견에 어떻게 반박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유니크
어느 개인이나 조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주는, 아니면 경험이 주는 위압감이 있는 것 같고, 이 경우는 친족이 얽힌 관계의 힘인 것 같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논리로 무장해도, 부모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선 조심, 겸손, 위축 등등을 겪는 것은 전 인간사회의 공통점 아닐까 싶네요.

장맥주
저 흐루쇼프 유머는 전에 다른 데서도 읽었는데 이번에도 헛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반전 자체도 좋고(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 안에 날선 비판까지 담긴 대단한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유머를 이렇게 설명나니 참 재미가 없네요. ^^;;;

borumis
뭔가 밀란 쿤데라 소설 '농담'에서 볼 듯한 유머에요.. ㅋ 농담 아닌 농담.. 웃겨 죽는 게 아니라 웃다가 죽는;;

장맥주
24장에서 오스카르 랑게가 인용하는 폴란드 노바후타의 블라디미르 레닌 철강 공장 이야기와 후일담도 그런 농담 같았습니다. ^^
알맹이
오늘 그믐 가입하고 오늘 퇴근길에 책을 사서 21장부터 읽었는데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가득한 챕터군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나요. 여기에 댓글을 달면 되는 걸까요..)

YG
@알맹이 님, 지금 이 모임은 6일 남았지만 다른 메모들 참고하셔서 꼭 완독하세요. 앞으로 남은 1주일 동안 틈틈이 감상 남겨주세요. :)

장맥주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장맥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읽다가 ‘응? 지금 오펜하이머 나이가 ○○살이라고?’ 이러면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나의 고향』 21장에서도 센 박사과정생 나이가 23세라는데 놀랐네요. 이런 이야기들 접하면 뭐랄까, 열등감이나 좌절감조차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천재가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두 책을 읽는 느낌이 참 다릅니다. 평전과 자서전이라는 차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펜하이머와 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천재이고, 창조적인 업적을 남겼고, 문학을 포함한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교양인이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 연민도 있고, 말과 글에 능하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을 매료시키는 마성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다 자기연출도 꽤 잘하는 인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센과 달리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압도하고 찌부러뜨리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 내면은 쌀쌀하고 황량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센 박사님은 그렇지 않네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특별판) -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특별판)는 오펜하이머 일대기의 결정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영화 개봉에 앞서 우리 독자들에게 더욱 널리 소개하고자 페이지를 압축하고 무게를 가볍게 했으며 정가를 낮춘 특별판이다.
책장 바로가기

borumis
그쵸.. 너무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 참.. 어떤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 정말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장맥주
똑똑함과 지적 매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똑똑한 사람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반짝 빛나지만 푸근하게 똑똑한 사람도 있고...

YG
@장맥주 @borumis 오펜하이머는 자기와 불화한 지도교수(심지어, 그도 노벨상을 수상한 훌륭한 과학자 패트릭 블래킷)에게 (말 그대로의) 독사과를 먹이려고 했잖아요. 센이 자기와 불화했던 조앤 로빈슨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 대조적이죠.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 둘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정체성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대인-백인-미국인-주류 정체성을 평생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오펜하이머와 반대로 수많은 정체성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상대화하며 특정한 정체성보다는 다양한 정체성이 중첩되는 상황에 익숙한 센이 차이가 한 원인이 아닐까요?

borumis
음 안그래도 성장배경을 읽으면서 약간 스스로 정체성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교육을 받아온 것 같더라구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유대인들을 만날 때 orthodox냐 아니냐에 따라 매우 느낌이 다르더라구요.

�장맥주
이런저런 유전과 다른 환경 차이도 작지 않았겠지만 말씀 듣고 보니 두 사람의 자아정체감이 무척 달랐을 거 같습니다. 오펜하이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면에서 경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겉보기로는 ‘유대인-백인-미국인-주류’라는 정체성에 딱 들어맞았지요. 반면 센은 어렸을 때 가족과 모국 문화와 튼튼한 유대 관계를 맺고, 그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선명한 타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이 그에게 무례하게 대했을 거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오펜하이머와 센이 그런 위치들을 어떻게 여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더러 선택하라고 하면 센의 위치가 더 나을 거 같아요. 그 편이 덜 외로울 거 같습니다. 가끔 배척당하는 일이 생기는 게, 늘 오해받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도교수 독살 시도 건은... 그냥 오펜하이머 뭔가 기질적으로 경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

YG
맞아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센은 안정적이었지만, 오펜하이머는 모든 관계에서 불안정했죠. 심지어 너무 친밀했던 동생, 연인, 부인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러믄요
E. M Forster 좋아해서 20장 더 재밌게 읽었어요.
화제로 지정된 대화

YG
오늘 금요일(7월 26일)은 22장 '돕, 스라파, 로버트슨'을 읽습니다.
이 장에서는 센이 진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세 경제학자 돕, 스라파, 로버트슨과의 인연과 그들에게서 센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은둔의 경제학자' 스라파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20세기 중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경제학자 가운데 천재 소리를 들었던 경제학자이면서도 딱 한 권의 저서를 내놓고 리카도 전집을 편집하는 데에만 몰두해서 정작 저서는 거의 없는 경제학자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YG
모리스 돕의 대표작은 1946년에 펴낸 『자본주의 발전 연구(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입니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1986년 동녘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서지 사항이 검색되는데요.
사실, 이 책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운동권 대학생의 필독서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청년 시절에 돕의 이 책을 만나서 영국사 특히 산업 혁명기를 연구한 걸출한 역사학자가 고 이영석(1953~2022년)입니다.
그가 펴낸 『삶으로서의 역사: 나의 서양사 편력기』(아카넷) 4장 '역사 연구의 길잡이'에는 자기에게 영향을 준 세 명의 역사학자가 나옵니다. 모리스 돕(1900~1976), 돕의 제자 에릭 홉스봄(1917~2012), 에드워드 톰슨(1924~1993). 홉스봄이야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에드워드 톰슨은 영국의 대표적 신좌파 지식인으로 『영국 노동 계급의 형성』으로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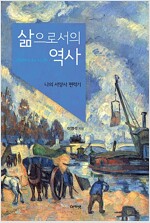
삶으로서의 역사 - 나의 서양사 편력기이영석의 <삶으로서의 역사>. 어느 서양사학자의 생애사이자 역사가로서의 연구 궤적을 보여주는 지성사다. 자신이 고민하고 방향 전환하고 몰두했던 연구대상과 자신의 탐구의 열망을 젊은 연구자와 일반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진솔하고 촘촘하게 배어 있다.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상이 책이 다루는 시기는 1780년대부터 1830년대 초반까지다. 최초의 민중적 급진파 협회였던 런던교신협회의 창립에서부터 서술을 시작해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노동자들의 선거권 쟁취 투쟁인 차티스트운동에서 멈춘다. 이 50여년 간의 역사에서 노동계급이 어떻게 형성돼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한겨레신문 고명섭 기자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하이 책이 다루는 시기는 1780년대부터 1830년대 초반까지다. 최초의 민중적 급진파 협회였던 런던교신협회의 창립에서부터 서술을 시작해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노동자들의 선거권 쟁취 투쟁인 차티스트운동에서 멈춘다. 이 50여년 간의 역사에서 노동계급이 어떻게 형성돼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한겨레신문
책장 바로가기
작성
게시판
글타래
화제 모음
지정된 화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