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맥주의 블로그
제 독서 메모는 마음대로 퍼 가셔도 괜찮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저자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고, 설정이 그럴싸해 보여서 메이페어 마녀 시리즈에 도전했다. 번역본으로 2권까지 읽고 나서 인내심이 바닥나 인터넷 서평을 찾아보니 하나같이 왜 이렇게 전개가 느리냐며 불평하는 내용. 결국 포기했다. 최근에 미국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던데 평가는 좋지 않은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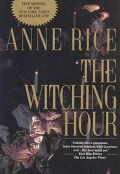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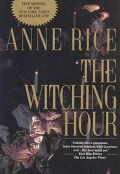
이 책 번역서가 무려 1990년대 한국 군대 어느 내무반 당직실에 있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모를 책을 한 달여에 걸쳐 밤에 몰래 읽었다. 참으로 비밀스럽고 알찬 시간의 사용이었다. 마사 누스바움은 이 소설의 교훈을 두고 ‘회상하는데 너무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썼다. 내게도 아주 실제적인 깨달음을 한 가지 준 책이다. 이후 소설의 정의를 확장했네 어쩌네 하는 실험소설들을 접하고 ‘그거 1950년대에 누보로망 작가들이 다 시도한 거야’ 하고 비웃는 일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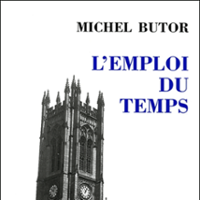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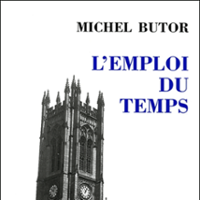
주인공도 있고 고정 캐릭터도 있으니까 초단편 시리즈라고 부를 수도 있을 추리 퀴즈 70편과 해설이 실려 있다. 심심할 때 땅콩 먹듯 몇 개씩 읽기 괜찮다. 가끔 억지스럽다 못해 허탈한 ‘트릭’들이 나오는 것은 각오하고. 저자가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니 이야기 배경들이 요즘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하고. 원래 신문의 한 코너였다고 하는데, 그 틀에 딱 적당하다.


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괴상하고 야릇한 경험담을 말하는 식으로 구성된 소설 장르가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데카메론』이 원조일 테고. 개별 이야기들이 종국에 하나로 뭉쳐지기도 하는데 그런 소설 중 최고봉이 이 작품 아닌가 한다(이미 이 책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린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런 결말이 아니더라고, ‘문학성’을 논하지 않아도, 개별 이야기들만으로도 매혹적.


30세가 되기 전에 시인의 시 「삼십 세」를 읽었고 감동했다. 30세가 한참 지난 지금도 좋아한다. 전자책으로 시집을 구매해서 휴대폰에 넣어 다닌다. 좋아하는 구절은 달라졌다. 시인이 조현병과 가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은 나중에 알았다.


〈장강명의 벽돌책〉을 연재하며 여태까지 두툼한 책들을 70권가량 소개했는데, 한 회에 2500쪽이 넘는 분량을 다룬 적도 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문화사가, 그리고 내게는 ‘무조건 믿고 읽는 작가’인 피터 왓슨이 쓴 『생각의 역사』 1, 2권이다. 1권 분량이 1240쪽, 2권이 1328쪽이다. 외형은 딱 찜질방 목침.
저자는 20세기 지성사에 해당하는 2권(원제 ‘A Terrible Beauty’)을 먼저 써서 유명해졌고, 그 뒤 원시시대부터 19세기까지 철학과 관념의 발전사를 훑는 1권(원제 ‘Ideas’)을 펴냈다. 그래서인지 두 책은 톤이 약간 다르다.
인물과 에피소드 중심인 2권은 읽기 편하고 재미있다. 나치 독일을 다루는 장에서 불륜 상대였던 제자 한나 아렌트의 곤경을 모른 체한 하이데거나, 해외 대학의 교수직 제안을 닥치는 대로 수락하고는 어설프게 연봉 협상에 나선 아인슈타인의 일화를 소개하는 식이다.
1권은 훨씬 밀도가 높고 날이 서 있다. 신문기자로 일했던 시절 나는 기사 분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오히려 사건의 본질이 선명해지는 압축의 마법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 책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다. 저자는 ‘현대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로마 공화정’이라고 딱 부러지게 정리하고, 불교의 화두 수행에 대해서는 ‘순간적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봤기에 동원한 황당한 명상과 난감한 논쟁’이라고 풀이한다.
대단히 지적이고 방대한 저작이긴 하지만, 『총, 균, 쇠』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같은 독창적 주장이나 야심은 없다. 그게 이 책의 장점이자 읽어야 할 이유가 된다. 비유하자면 이 책을 읽는 일은 머릿속에 크고 튼실한 서가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 머릿속에 난삽하게 쌓여 있던 많은 책을 그 형이상학적 책장에 꽂아 정리하면서 새롭게 맥락과 의미를 깨칠 때의 짜릿함이란! 어떤 생각은 내용만큼이나 놓인 위치도 중요하기에. 다만 유럽인이 만든 책장이라 다소 유럽풍으로 짜여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주제나 분량이 엄청난 만큼 출간에 얽힌 일화도 많다. 1권을 옮긴 남경태 번역가는 아예 몇 달 동안 들녘 출판사 4층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다고 한다. 두 책의 색인을 만드는 데에만 보름이 걸렸다고. 담당 편집자였던 선우미정 현 푸른들녘 주간은 과연 이걸 누가 읽을까 고민하면서 작업했다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책은 잘 나갔다. ‘빅 히스토리’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였다.


신간 소설을 신문, 라디오, 심지어 TV에서도 광고하던 시절, 국내 출판사가 이 책을 엄청나게 광고했었다. 존 그리샴이라는 신성에 대한 궁금증도 컸다. 하지만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였는지, 음모는 억지스럽게, 결말은 허무하게 느껴졌다. 주인공 법대생이나 초특급 킬러나 별 매력 없는 기성품 같았고. 첫 만남이 별로였던 터라 이후 이 작가의 작품을 멀리하게 됐다는 슬픈 사연.


한국에는 ‘깊은밤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깊은밤 깊은곳에』의 속편인데 발표 시기는 17년이나 차이가 난다. 전편을 쓸 때 시드니 셀던은 막 극작가에서 소설가로 전업한 에너지 넘치는 작가였고, 이 책을 낼 때는 태작을 내도 판매량이 보장되는 슈퍼스타였다. 시드니 셀던스러운 클리셰들이 넘치지만, 그는 역시 노련한 스토리텔러여서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빨려 들어가게 된다.


여러 국내 출판사에서 여러 제목으로 번역했던 걸로 기억한다. 깊은밤 깊은곳에, 깊은 밤의 저편, 한밤의 저쪽, 배반의 축배 등등. 그만큼 요란하고 재미있는 작품이었다. 얄팍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힘이 없다는 말은 절대 못한다. 인상적인 캐릭터들도 많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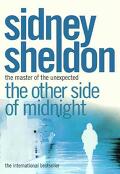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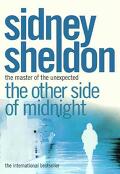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드니 셀던은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다. 나중에는 성의가 없어 뵈는 작품도 많이 썼지만, 데뷔�작인 이 소설은 정말 재미있다. 서스펜스도 대단하고, 반전도 일품이고, 앞뒤도 딱딱 들어맞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