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맥주의 블로그
제 독서 메모는 마음대로 퍼 가셔도 괜찮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유사역사학 서적이며, 이 책을 끝으로 더는 이런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재미있게 읽긴 했다). 그때는 두 권짜리였는데 개정판이 나오면서 한 권으로 합쳐졌다. 초고대문명 이야기에 대한 수요는 늘 확실한가 보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그레이엄 핸콕의 이름을 걸고 초고대문명 다큐멘터리를 만든 걸 보고 이 양반 아직도 살아 있었네 하고 놀라서 써본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의미도 훌륭한 저작인데 절판 상태다. 전체 18장 중 두 장을 마이클 루이스가 썼는데 참 잘 썼다. 4분의 1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는 버나드 메이도프 사기사건 이야기는 따로 책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 비서의 시선에서 메이도프라는 인물과 그의 ‘성공’ 과정을 보여주고, 사기극이 드러나는 순간 메이도프가 두 아들을 어떻게 감쌌는지,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했는지 추적하며, 폭로 이후 부인의 몰락 과정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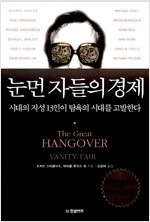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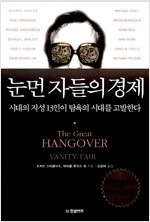
명쾌한 결론이나 해법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최대한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그 문장들이 몹시 유려해서 어쩐지 그것만으로도 위로 받는 기분이 든다. 좀 길긴 하지만 우울증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도 추천한다. 암흑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간혹 벼락 같은 통찰을 주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많고 매혹적인 삶’, ‘가족도, 친구들도, 일도 포기하지 않는 서툴지만 열정적인 저글링 곡예사’, ‘고통의 반대는 권태’ 같은 문구에 담긴.


어린 시절, 환경운동을 고깝게 여겼던 때가 있었다. 딱히 뭘 알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일부 운동가들의 감상주의나 어딘지 맹신적인 분위기가 탐탁치 않아서 그랬다. 딴에는 그럴싸한 반론도 한 가지는 있었다.
‘인구 폭발, 석유 고갈, 핵전쟁, 그 외에 이런저런 비관론들이 모두 빗나갔지 않은가. 지구온난화도, 여섯 번째 대멸종도 그런 호들갑이겠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낼 거야. 인간은 의외로 강하고 질기다니까.’
그런 생각은 『문명의 붕괴』를 읽고 난 뒤 확실히 바뀌었다. 이 788쪽짜리 두툼한 책에서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아니야, 꽤 큰 사회가 환경 재앙으로 완전히 망한 적이 최소한 몇 번은 있었어’라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과거 문명이 그렇게 망할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고, 지금 우리 세계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이아몬드가 예로 드는 ‘망한 사회’는 고대 이스터 섬, 핏케언 섬, 아나사지 문명, 마야 문명, 노르웨이령 그린란드 등이다. 망한 거나 다름없었던 내전 당시 르완다와 최근의 아이티도 비중 있게 다룬다. 저자는 이들 사회의 몰락을 자연환경이 인구를 지탱하지 못한 데서 찾는다. 르완다 내전 사태에서도 부족 갈등 아래 높은 인구밀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사회의 공통점 중 가장 섬뜩한 건, 상당수가 전성기에 이른 뒤 갑자기 몰락했다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한 사회는 전성기로 갈수록 삼림을 파괴하고 땅의 지력을 훼손하는 등 환경파괴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을 때 자원이 부족해지고, 싸움이 일어난다. 주변이 막힌 고립된 사회가 그 단계까지 가면 평화롭게 서서히 기운을 잃기보다는 유혈사태 속에 급격히 파멸하는 듯하다.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이제 세계는 고립된 단일 문명이며 인류는 환경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중이다. 너무 늦기 전에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저자는 책 뒷부분에서 미국, 호주, 중국 같은 현대국가들이 생태적으로 얼마나 위태로운지 진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시한다.
그런 제안들은 감상이나 맹신 대신 신중한 회의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과거의 비관적인 예측 상당수가 빗나갔다고? 다이아몬드는 “화재 신고가 몇 건 잘못 들어왔다고 소방서를 없애자는 주장이 옳으냐”고 묻는다.
2004년에 나온 책이라 중국에 대한 내용 일부는 지금 현실과 다소 안 맞을 수 있다. 이스터 섬의 몰락 원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설이 계속 나오는 중으로 안다. 그러나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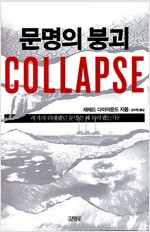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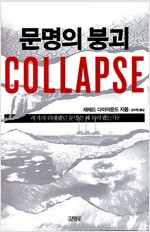
‘서양의 리얼리티는 하나의 구성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나이지리아 작가 벤 오크리의 부커상 수상작. 나는 이제 우리 모두 서양인이라는 생각도 한다. 앞부분에서는 생과 사의 경계를 사는 소년 아자로가 주인공인데 뒤로 갈수록 아자로 아버지의 비중이 커진다. 거기에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 독자로서는 아자로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었다.


『종의 기원』이 그렇게 읽기 어렵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 책은 재미있다. 젊은 다윈은 호감 가는 인물이었고 신기한 걸 많이 봤고 글도 재치 있게 잘 썼다. 등은 검고 배는 새빨간 두꺼비를 묘사하면서 “이 두꺼비에 이름이 없다면 ‘악마’라고 부르면 딱 맞을 것 같다”고 적는 식. 진화론이라는 위대한 아이디어의 싹이 트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미지는 파타고니아 평원이다. 다윈이 말한 ‘외딴 곳에서 받는 감동’을 나는 매우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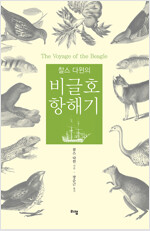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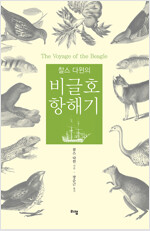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고립된 병원에서 가망 없는 환자들을 안락사시킨다. 수사기관이 의사들을 수사한다. 이 짦은 두 문장에 얼마나 큰 고뇌와 드라마를 담을 수 있는지 모른다. 기자 후배들에게 강권하고 싶다. 이게 매스미디어 종말 이후 저널리즘의 미래다. 나는 읽다 말고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하고 싶은 논픽션의 걸작이었는데 별로였다고 하는 독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20대에 데뷔하자마자 유명해져서는 40대 초반에 전미도서상을 수상하고 그 뒤로 상복이 애매한 조너선 프랜즌. 이 소설이 ‘모든 신화의 열쇠’라는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했는데, 아마 필생의 역작을 쓰려고 하는 모양이다. 모든 인물들이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며 함께 몰락하는 기하학적이고 가학적인 구조를 작가가 짜놓지 않았을까 두려웠는데 기우였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걸친 서민층 가족의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대하소설 같은 기분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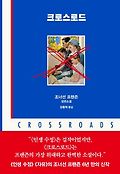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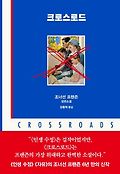
땅에서 멀리 떨어진 무언가를 열렬히 쫓고 고통스러워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에로틱한 사랑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 과학자만 모은 책도 아니고, 작가만 모은 책도 아니다. 여성과 성소수자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그들만 다루지는 않는다. 그 삶들을 특정 테마에 따라 깔끔하게 정렬하지도 않았다. 애초에 선별 기준과 순서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는 태도다.


19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까지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과학 기사 125편을 엮었다. 『종의 기원』 출간 당시 서평도 있고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 르포도 있다. 뉴욕타임스 과학 담당 기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목격자임을 알아서, 투탕카멘왕의 무덤 발견이나, 달 착륙, 월드와이드웹 개발을 보도하는 기사에는 당시의 흥분과 전율이 생생히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