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맥주의 블로그
제 독서 메모는 마음대로 퍼 가셔도 괜찮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평행세계 SF 코믹 일상 첩보물. 하루키가 이런 분위기로 강치나 양사나이가 나오는 귀여운 단편을 가끔 썼는데, 그 확장판 같은 느낌. 대단한 야심은 없지만 ‘귀여우니까 괜찮아.’ 귀엽고 싱겁게 막나간다.


제임스 엘로이는 에세이에서, “반항 소녀는 혐오스러우면서 매력적”이라고 썼다. 이 책에 딱 어울리는 말 같다.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벗을 때까지 맞았어’ 같은 짧은 문장들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를 아주 좋게 읽었고, 내가 왜 시간에 쫓기는지, 그게 내 탓인지, 시간에 쫓기지 않을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서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원제는 ‘The Time Paradox’이며 SF에 나오는 그 타임 패러독스 얘기도 아니다. 시간관이라는 접근법이 삶에서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전에 몰랐던 새로운 통찰을 주는지도 의문.


동성애가 가혹하게 배척되는 시대에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두 여인, 그리고 그 사이에 범죄가 끼어든다는 점은 『핑거스미스』와 같다. 성애 묘사가 생생하면서 아름답다는 점도. 하지만 『핑거스미스』처럼 현란하게 플롯을 꼬아놓지는 않았다. 그래서 서스펜스의 반전의 재미는 덜한 대신 두 주인공의 고통에 보다 집중한다. 책장을 덮으며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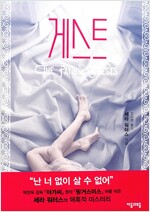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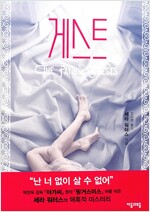
비밀을 품고 살았던 은둔의 예술가들이 있다. 비비안 마이어는 보모와 가정부로 일하며 수십만 장이나 되는 사진을 찍었지만 생전에 발표하지 않았다. 헨리 다거는 병원 잡역부로 일하며 1만5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서사시를 쓰고 삽화 수백 장을 몰래 그렸다. 그런 종류의 낯설고 집요한 창조성이 있는 것 같다.
고(故) 박지리 작가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른다. 그는 다른 작가와 어울리지 않았고, 인터뷰와 행사를 피했다. 출판사의 전화나 메일에도 몇 달씩 답하지 않곤 했다. 856쪽짜리 소설을 내면서 ‘작가의 말’ 쓰기를 거부했고, 책이 나오고 8일 뒤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일이었고, 작가는 31세였다.
그 작품 『다윈 영의 악의 기원』은 아주 낯설고 집요한 소설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출신 지역에 따른 신분제가 엄격히 유지되는 가상 세계에서, 엘리트 학교에 다니는 십대 주인공이 과거의 살인사건을 추적한다’는 줄거리다. 그러나 『헝거 게임』 유의 영어덜트 SF를 떠올리면 곤란하다. 설정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야기는 그 문법에서 한참 멀다.
모험극이라기보다는 사변소설이며, 분위기는 대단히 어둡다. 3대에 걸친 악(惡)의 기원을 쫓아 심연으로 향하는 주인공의 뒤를 독자들이 고통스럽게 따라 걷게 만든다. 청소년소설로 분류하기도, 성장소설이라고 부르기도 망설여진다. ‘현실비판, 사회비판’이라는 전천후 독법에도 썩 들어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해설 없이도 그 자체로 강렬하다.
책의 정서적, 물리적 무게도 그렇거니와, 영미식 이름을 한 등장인물들, 과거인지 미래인지 모호한 시대 배경, 독자의 호오가 뚜렷이 갈릴 결말 같은 요소들은 ‘최근 한국소설 트렌드’에 정면으로 맞선다. 돌연변이 같다. 이런 괴물 같은 소설을 무슨 계기로 어떻게 쓴 건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사계절출판사의 김태희 팀장은 “작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거의 대답하지 않았고 가끔 ‘그냥요’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젊고 재능 있는 예술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도 끝내 수수께끼로 남았다.
박지리 작가는 25살부터 6년 동안 한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색깔의 장편소설 네 편과 단편 한 편을 냈다. 그 글을 모두 사계절출판사에서 김 팀장을 통해 발표했다. 출판사와 편집부는 작가를 진심으로 아꼈고, 지난해에는 고인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해 『다윈 영의 악의 기원』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다.
늦었지만 이런 칼럼을 통해서라도 흔치 않은 작품이 자신을 알아봐줄 독자를 더 만나면 좋겠다. 고인의 유작 『3차 면접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MAN에 관하여』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무책임할뿐더러 자기보호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형편없다. 그럼에도 그가 기본적으로 선량한 인물이고,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도 틀림없다. 그는 뒤늦게나마 세계에 대한 의무감도 품는데, 그 방향이 적절하고 현명한지는 따져볼 여지가 많다. 이 문장들은 주어를 ‘인류’로 바꿔 다시 써도 여전히 옳은 관찰 같다.


독특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상보다 더 독특했고, 그런 점은 좋았다. 동명 영화와는 제목만 같을 뿐이며, 제임스 본드는 절반이 지나고 나서야 등장한다.


007 단편집. 아홉 편이 실려 있는데 그중 세 편은 서머싯 몸의 『어셴든, 영국 정보부 요원』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인간 드라마다. 그런 작품들이 특히 재미있었다. 플레밍은 묘사를 엄청 생동감 있게 잘 한다.


이 작품은 영화가 소설보다 나은 것 같다. 『카지노 로얄』 때보다 본드는 노련해졌고 사건은 규모가 커졌지만 양쪽 다 뭔가 하려다 만듯한 인상. 미스터 빅은 매력 있다.


2006년 영화가 원작 소설의 분위기를 살렸다고 하지만 내 감상으로는 원작 주인공과 대니얼 크레이그가 연기한 제임스 본드는 다른 인물이다. 그리고 나는 소설이 영화보다 더 재미있었다. 더 깔끔하기도 하고. 르쉬프르가 소련의 조직책이라는 설정이 있으니 왜 그를 굳이 도박으로 파산시켜야 하는지, CIA가 왜 본드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지가 설명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