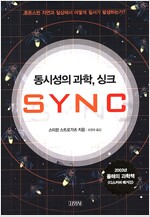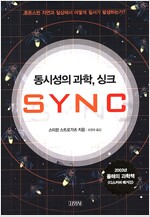장맥주의 블로그
제 독서 메모는 마음대로 퍼 가셔도 괜찮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이성과 과학을 믿고 계획대로 사는 중년 남성 발터 파버가 그리스 비극 같은 운명의 장난을 겪게 된다. 오이디푸스는 죽은 아내의 브로치로 자기 눈을 찔렀고, 파버는 자기 앞에 놓인 포크를 보면서 ‘왜 나는 내 눈을 찌르지 않는가’ 하고 자문한다. 파버가 극중 과거에 겪은 사건은 실제 작가의 경험이라고 한다.


왕자인 오빠와 공주인 여동생이 근친상간을 저질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여왕이 된 어머니와 다시 근친상간을 저지른다. 그 아들이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다. 토마스 만의 후기 대표작인데 중세 서사시를 재해석한 내용이라고 한다. 원죄라든가 구원 같은 것을 애써 고민하지 않고 읽어도 이야기 그 자체로 재미있고 문장도 아름답다.


이 책이 부커상을 받은 게 1997년인데 바로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고 1998년에 문이당판으로 읽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아룬다티 로이의 문장 양쪽 모두 충격이었다. 지금도 마지막 페이지가 기억난다. 이후로 아룬다티 로이의 다음 작품을 기다렸으나 그녀는 이후 20년 동안 소설을 쓰지 않았다.


물리학의 역사를 소개하는 교양서. 책이 소개하는 7가지 과학혁명은 코페르니쿠스 천문학, 뉴턴 역학, 에너지 개념, 엔트로피 개념,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소립자물리학이다. 원제도 ‘Seven Ideas that Shook the Universe’인데 사람들의 인식이 흔들린 거지 우주는 꿈쩍도 안 했을 거라고 이죽거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저널리스트 출신 저자 웨난은 중국 유적 발굴 현장을 돌아다니고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을 취재해 ‘중국 고고학 논픽션’이라고 할 만한 책들을 펴냈다. 그 중 하나인 이 책은 명십삼릉 중 그 유명한 만력제의 무덤인 정릉 발굴에 얽힌 이야기를 다뤘다. 발굴 과정은 흥미롭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학자들과 유적이 처한 운명은 안타깝다. 공동 저자인 양스는 강제노역 기간에도 몰래 보고서를 작성한 발굴단장 자오지창의 부인.


동아일보 〈내가 만난 명문장〉 코너에 글을 실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28/123270273/1
‘인간은 자살하지 않고 살기 위해 신을 생각해 낸 것이다. 이때까지의 세계사는 바로 이것에 불과한 거야.’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악령’ 중
스물두 살에 이 문장을 접했다. 이철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번역한 범우사판 ‘악령’ 하권에서였다. 이후 25년 넘게 이 두 문장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심한 과장은 아니다. 열린책들판에서 박혜경 한림대 교수는 같은 대목을 ‘인간이 한 일이라고는 자살하지 않고 살기 위해 신을 고안해 낸 것뿐이지.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가 그랬어’라고 옮겼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 이 대사는 키릴로프라는 인물이 한다. 그는 무신론자이자 허무주의자로, 객기나 냉소가 아니라 진지한 고찰 끝에 저렇게 말한다. 도스토옙스키는 같은 사상을 지닌 인물을 몇 명 더 창조했는데, ‘죄와 벌’의 스비드리가일로프,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의 이반 카라마조프 등이다. 그중에서도 ‘악령’의 키릴로프는 자기 신념을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자신에게 자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무서운 결론을 내리고 그걸 실천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무신론을 반박하기 위해 창조한 캐릭터가 후대의 무신론자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예를 들어 알베르 카뮈의 철학 에세이 ‘시지프 신화’에서는 한 챕터의 제목이 ‘키릴로프’다. 카뮈가 이 책 전체에서 다루는 문제도 바로 키릴로프가 매달렸던 그 질문이다. 인간은 왜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신 외에 어떤 다른 대답을 댈 수 있는가?
나는 나대로 거기에 답해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막연하다. 저 두 문장에서 시작한 소설을 써보기도 했다. 살 이유가 없다며 연쇄 자살을 벌이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나, 신 대신 다른 윤리의 기반을 발명하려는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 아마 앞으로도 몇 편 더 쓰게 될 것 같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가끔은 부럽기도 하다. 동시에, 그 노력이 불러일으키는 긴장 상태가 일종의 축복이라는 생각도 한다.
주인공은 고서적 사냥꾼이고 악마숭배주의자들의 음모가 나오고 분위기는 『장미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데 200만 명이 읽은 베스트셀러이고, 로만 폴란스키가 영화로 만든다고 하니 읽지 않을 도리가 있나. 그런데 결말이……. 이 책 때문에 『단테 클럽』에 손이 안 간다.


무게는 1킬로그램에 가깝고 마르크스의 얼굴이 표지에 크게 그려져 있는 책인데 너무 안 읽혀서 오래 들고 다녔더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내용을 궁금해 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복수를 했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직 자본주의가 충분히 썩지 않았대” 하는 식으로 답하곤 했다. 저자가 정치인인 걸 일찍 알았더라면 금방 내려놨을지도 모르겠다.


『동시성의 과학, 싱크』가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읽은 복잡계 이론에 대한 교양서. 이 책도 어럽지 않고 재미있었다. 지진과 산불 발생, 주가의 등락, 고속도로 통행량 변화처럼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사건들 뒤에 멱함수 법칙 같은 간단한 패턴이 있다. 임계상태에서 일어나는 격변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은 우주와 삶에 대한 교훈으로 다가오기까지 한다.


저자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수학자. 글도 재미있게 잘 쓴다. 태양계의 행성들, 인간의 신체, 반딧불이 같은 곤충, 원자와 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동조 현상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소개한다. 그런 현상들이 거의 신비스럽게 느껴졌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 『뤼미에르 피플』에 실린 단편 「동시성의 과학」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