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맥주의 블로그
제 독서 메모는 마음대로 퍼 가셔도 괜찮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늙고 눈 먼 개가 나오니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츤데레 캐릭터인 ‘751’이 툭툭 던지는 허무개그 같은 대사가 재미있었다. 작가가 직접 책을 팔아야 한다면 정말 아무도 소설을 쓰지 않을까?


공중파 방송사의 신년기획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고 왔다. 내가 내레이터 역할을 한다. 아직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정치 팬덤과 여론 양극화 현상을 다뤘다. 소셜 미디어, 유튜브, 뇌 과학 연구를 곁들인다.
촬영 뒤에 비난을 받게 될지 모른다며 제작진이 걱정해주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관심 있는 주제였다. 인터넷 시대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논픽션도 따로 구상 중이다.
단독 단행본에 들어갈 글을 쓰는 게 아닌 다른 일들은 모두 부업이라고 여긴다. 강연이나 방송 출연이나 일회성 기고문 등등. 하지만 부업도 천차만별이다. 어떤 일은 하는 동안 제법 보람을 맛보기도 하는데 이번 촬영이 그랬다.
그런데 힘들긴 했다. 여의도와 서강대교 한가운데에서 각각 야외 촬영을 했는데 서울 평균기온이 영하 8.3도인 날이었다. 다리 위에서는 입이 얼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핫팩 두 개를 틈틈이 뺨에 갖다 대고 입술 주변을 열심히 풀어보려고 하지만 대단한 효과는 없었다.
여의도에서 예고편을 찍고, 서강대교 위에서 오프닝을 촬영하고, 방송국 카페에서 오프닝 다음 장면을 찍었다. 그렇게 세 장면을 촬영하는데 꼬박 8시간이 걸렸다. 방송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분량은 다 합해서 5분이나 될까? 그날 촬영분을 맡은 선배 기자가 “날이 너무 추워서 장 작가가 고생할까봐 정말 최소한으로 찍었어요” 하고 설명해주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어보면서 다양하게 화면을 확보한다고.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PD가 아니라 기자들이 연출을 맡는다. 선배는 신문기자 출신이다. 나와 같은 경찰서를 출입한 인연이 있다. 나는 이번 촬영 전까지 그가 방송기자가 된 줄도 몰랐었다. “방송이 신문보다 더 마음에 드세요?” 하고 물었더니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답한다.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 연출을 맡은 후배 기자는 동아일보 출신이다. 나는 그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한 팀에서 일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 내가 야당을 출입할 때, 그는 여당을 맡았다. 단독 기사들을 쏟아내는 에이스 기자였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얼마 뒤 그가 방송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촬영을 마치고 여의도의 한 레스토랑으로 가서 셋이 저녁을 먹었다. “뭘 드시겠어요?” 후배가 메뉴판을 내밀었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클라우드라는 단어밖에 없었다. 와인은 여러 종류를 갖췄는데 맥주는 오로지 클라우드 병만 파는 식당이었다. 그리고 나는 촬영하는 내내 ‘아, 이거 마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되뇌었던 참이었다.
나도, 선배도, 후배도 클라우드를 시켰다.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는 정말이지 오랜만이었다. 내가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아서만은 아니었다. 기자 출신들이라서 더 잘 통하는 게 있었을 거라고 내심 생각한다.
선배는 내가 최근에 쓴 칼럼들을 인상적으로 읽었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이 모두 서로 존댓말을 쓰자는 제안을 적은 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이 모두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선배는 나에게, 나는 후배에게 깍듯하게 존대했다. 40대 남자 세 사람이 모였는데 이런 분위기인 술자리는 꽤 드물겠지… 아니, 한국 사회도 이제 바뀌고 있나?
이것저것 이야기했다. 다들 조곤조곤 말하는 타입이었다. 선배는 등단한 영화평론가이기도 했고, 동물권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육식을 삼갔다. 후배는 자신이 컴퓨터게임에 푹 빠져 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게임이 예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화도 한때 그런 의심을 받았다. 《사이버펑크 2077》과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뉴스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세 사람 모두 극히 비관적이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다들 설득력 없는 답을 내놓았다.
셋이서 클라우드를 11병 마셨다. 내가 네 병, 선배가 네 병, 후배가 세 병. 후배는 그렇게 술을 마시고 회사로 돌아가 편집 작업을 한다고 했다. 전에는 사흘 동안 편집실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진 어떤 뉴스를 혼자 사흘간 몰랐다고 한다.
선배는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집에 간다고 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고, 종로구 어디에 작은 집을 지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만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너무 피곤했다. 기자 정신이 그새 많이 사라진 거야.
선배와 후배가 너무 정중하게 나를 배웅하는 것 같아 조금 서글펐다. 그 모든 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럼없는 친구가 되지는 못할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한 살만 차이 나도 친구가 되기 어렵다. 언론계에서는 입사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상대에게 존댓말을 쓰며,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다. 특히 어떤 나이를 넘기면.
클라우드는 내가 썩 좋아하지는 않는 맥주다. 다른 맥주를 마실 기회가 있을 때 굳이 클라우드를 고르지는 않는다. 국산 라거 맥주 중에서도 그렇다. 기존 국산 맥주와 다른 맛을 내기 위해 롯데칠성음료에서 3년 간 개발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유통망은 열심히 관리했나 보다. 다른 맥주는 하나도 팔지 않고 클라우드 병만 파는 음식점이 있는 걸 보면.
이 맥주가 출시될 무렵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미각이 트인 상태였다. 스무 살쯤에 만났더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더 일찍 만났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었겠죠?
아쉬운 가정법


이 주제를 다룰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설적 전략은 작가가 신이 되어 작품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주인공을 성인(聖人)으로 만들어주는 것일 테다. 그러나 작가는 그 길을 거부한다.


‘회사 3부작’의 둘째 편. ‘데이터베이스 소설’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시스템의 특징이며,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을 드러내고 그 힘을 활용하는 한 가지 접근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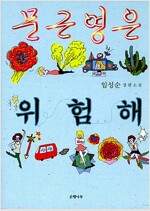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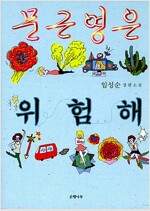
유사한 설정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김언수의 『설계자들』과 비교하면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설계자들』은 행동대장들 이야기이며, 『컨설턴트』야말로 설계와 구조에 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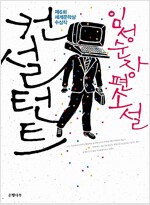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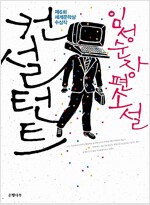
여태까지 읽은 생존 소설가의 자전 에세이 중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 매우 추천. 사랑스럽기도 하고.


포틀랜드, 방콕, 말라가 여행보다 연남동 저녁 산책이 더 부럽다. 빛에 따라 눈동자 색이 달라지는 �시베리안 허스키와 산책할 줄 아는 고양이들. 사랑하는 동네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다 읽는 데 오래 걸렸다. 여행이나 출장 갈 때 들고 다니며 '여기가 더블린보다는 낫네' 하고 생각했다.


살인적인 폭설에 파묻힌 소도시와 인간 군상의 묘사가 흥미롭다. 한데 이야기는 발동이 너무 늦게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HJ는 무척 재미있게 읽었다고 한다.


성실한 외부인이 증언하는 남과 북. 흥미진진하다. 주변국에게 남북한은 양쪽 모두 고집스러운 골칫덩이였다. 개인 숭배의 지속 비결을 묻는 소련 간부에게 김일성은 “유교 덕분”이라고 답했다.
전면전을 한번 더 일으키려는 김일성�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박정희를 중국, 소련, 미국이 뜯어 말렸다. YS도 퍽 위험한 인간이었다. 노태우의 북방외교는 높게 평가되고, 비자금 시인도 결단처럼 묘사된다.



